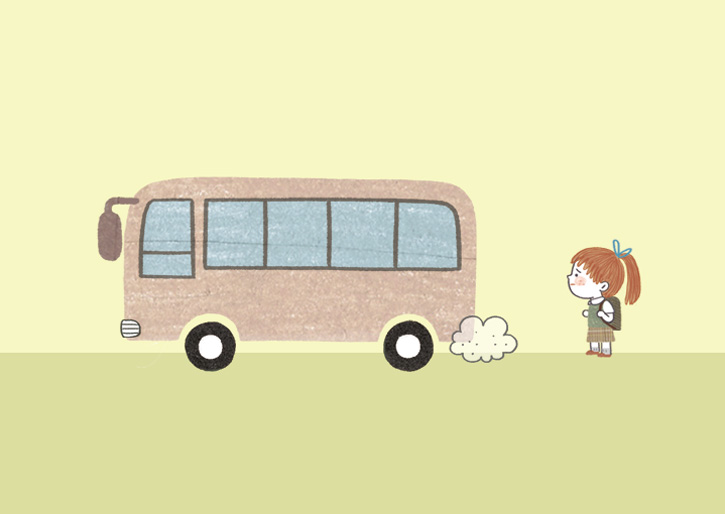
학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 때문인지, 어렸을 때부터 워낙 밥에 진심인 편이라 그랬는지 눈물이 날 만큼 슬프고 속상했다. 그때 엄마가 생각났다. 전화로 자초지종을 토로하니 엄마가 말했다.
“엄마가 데리러 갈까? 엄마랑 같이 저녁 먹을래?”
엄마가 학교까지 오는 게 번거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입은 이미 “응”이라고 대답하고 있었다.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 통화했다.
“나는 밥을 못 먹으면 우울해지는데 오늘 너무 우울한 날인 것 같아.”
“우리 딸 밥 못 먹으면 우울하지. 근처 식당에 들어가서 먼저 주문해 놔. 엄마 도착하면 같이 먹자.”
“엄마, 오늘 학교에서 말이야….”
“애고, 그랬구나!”
통화하는 내내 엄마는 내 말에 공감하며 위로해 주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어느새 미소를 되찾았다. 역시 엄마는 엄마였다. 엄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졌다.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다.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좋지만, 왠지 낯간지러워서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투정을 부린 날이 많았다.
생각해 보면 항상 내 영혼을 염려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의 기도보다는 내가 바라는 것을 더 많이 구했던 것 같다. 영육 간 부모님에게 받은 만큼 사랑을 표현하며 효도하는 딸이 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