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방은 노크하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내 방 출입은 이다지도 자유롭다.
“오빠, 일요일이라고 너무 자는 거 아냐? 일어나서 이거 좀 봐봐.”
실눈을 뜨다가 깜짝 놀라서 눈이 번쩍 떠졌다. 동생이 자기 무릎을 내 눈 바로 앞에 대고 있었다.
“여기 딱지 앉았어. 딱지 떨어지면 새살 나는 거지? 진짜 신기하지 않아? 그렇게 피가 많이 났는데 어떻게 상처가 낫는 거지? 오빠는 알아?”
정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다. 좀 더 나이 먹으면 중학교에서 알려줄 테니 이 얼마나 좋은 교육인가. 그러나 또 대충 말했다가는 따발총을 맞을 확률이 높았다.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이뤄져 있어요. 그리고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혈소판은 피가 나면 피를 굳게 해서 멈추는 일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무는 거랍니다.”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했다. 동생은 입을 쩍 벌리고 하품을 했다.
“오빠는 진짜 말 재미없게 해.”
동생은 바로 방을 나갔다. 나는 그대로 누워 힘껏 이불킥을 날렸다.
거실로 나가니 엄마 아빠가 없었다. 어제, 외출했다 늦게 온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동생은 심심해서 나를 깨운 것이었다. 지난번에 싸운 친구랑 아직도 화해를 못해서 나가 놀 약속도 없는 모양이었다. 식탁에 차려진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있는 동생 옆에 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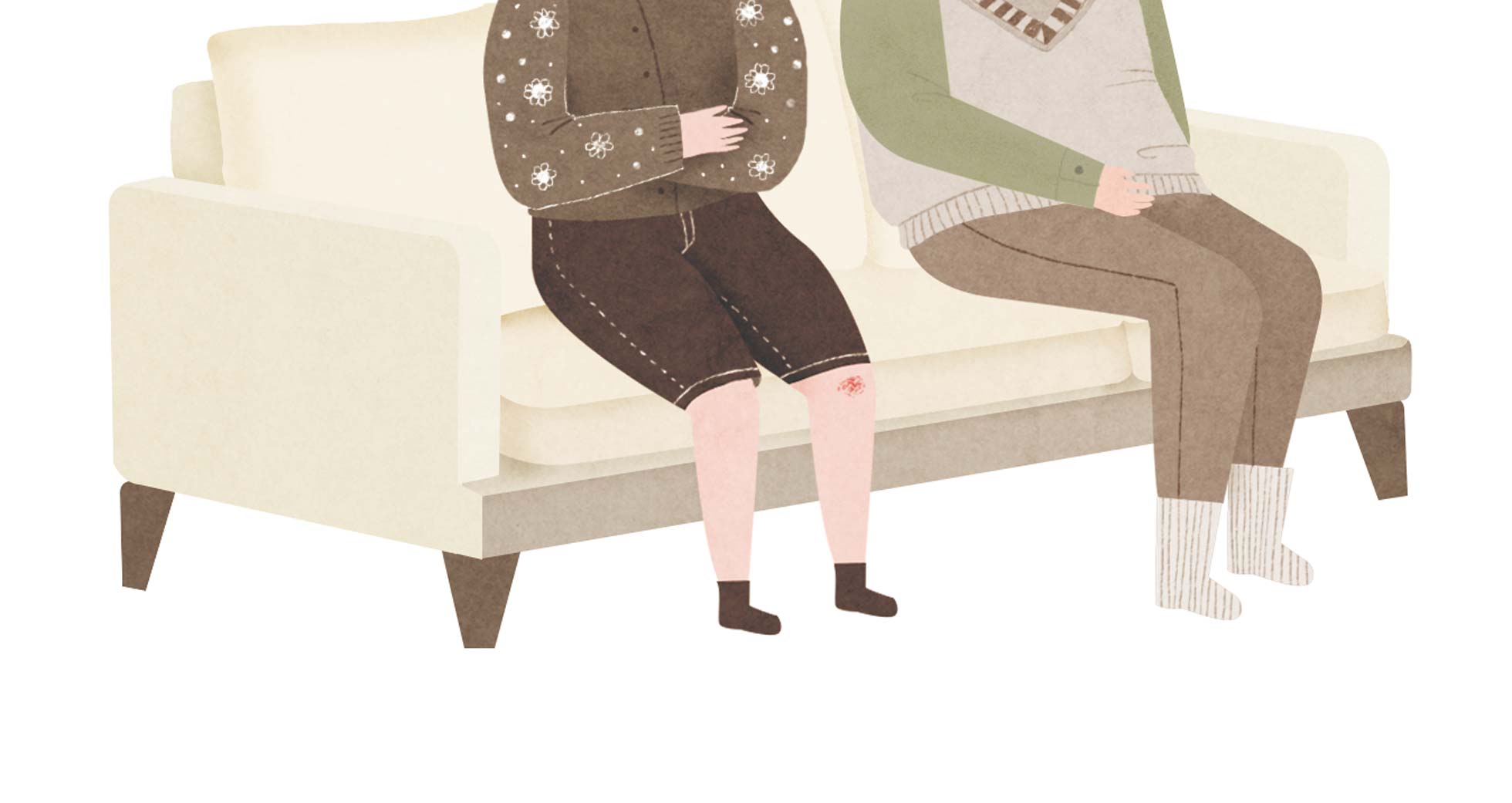
예상치 못한 기습 질문이었다.
“응. 상처가 너무 크면 또 모르지.”
“마음도 그래?”
심오한 말을 하다니, 동생이 사춘기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왜? 친구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둘 다.”
하필 베란다에 있는 화분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가 오늘은 물을 못 주고 나갔을 것 같았다. 화분에 물을 주러 베란다로 갔다. 팔팔했던 작은 줄기마저 기운이 없어 보였다.
칙- 칙-
분무기에서 뿜어져 나온 물 입자처럼 분위기가 고요히 가라앉았다.
‘시간만으로는 안 된다. 정성이 있어야 한다.’
베란다 문을 빼꼼 열고 말했다.
“최예린. 정성을 보여 봐.”
“뭐?”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니니까 네가 먼저 사과하든지 마음을 보이라고.”
“에이, 누가 그걸 몰라? 하기 힘드니까 이러는 거잖아.”
“그럼 상처 곪아. 양쪽 다.”
“싫어! 안 해! 오빠 미워!”
동생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저 질문에 성실히 답했을 뿐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동안 동생을 상대하면서 통달한 진리가 있다면 사춘기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만 잘 넘어가면 하루가 평화롭다.
직장인에게만 월요병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학생들에게도 월요병이 있다. 나 역시 월요병을 힘겹게 이겨내고 집에 무사 귀환 했다. 그런데 방문을 열자마자 힘이 쭉 빠졌다. 내 침대가 자기 소파라도 되는 양 동생이 아주 편한 자세로 기대어 앉아 있었다. “나가”라고 외쳤다. 마음으로.
“오빠! 빅 뉴스!”
궁금하지 않았다.
“서희랑 화해했다!”
“어, 축하.”
동생은 미간을 찌푸리고 따지려다가 기분이 좋은지 금방 얼굴을 폈다.
“내가 먼저 사과했어.”
싫다면서.
“내가 손을 탁 내밀었더니 서희가 막 울면서 자기도 미안하다고 하더라. 나 좀 멋있지?”
그럼 어제는 왜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낸 것일까.
“엄마랑은?”
동생 표정이 굳어졌다.
“기분 좋았는데 오빠 때문에 망쳤어.”
동생이 토라져서 방을 나갔다. 나는 침대에 털썩 드러누웠다.
다시 어색한 저녁 식사 시간이 돌아왔다. 다른 애들 같으면 단식 투쟁이라도 할 텐데 동생은 밥은 먹어야겠는지 꼬박꼬박 저녁상에 앉았다. 아니면 계속 엄마를 주시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사춘기라도 사랑받고 싶을 테니까. 밥 먹고 베란다로 나가는 일도 익숙해졌다. 그런데 기운 없던 화초의 큰 줄기가 일주일 만에 생기가 돌았다. 엄마한테 말하려고 거실로 나왔다. 아빠만 거실에 앉아 있고 엄마가 보이지 않았다. 동생도.
“엄마랑 예린이는요?”
아빠는 턱으로 동생 방을 가리켰다. 드디어! 엄마와 동생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원래도 안 했지만― 마음고생한 우리 집 남자들이었다. 이제는 제발 끝나야 했다.
“으아앙!”
울음소리를 듣고 아빠와 나는 놀라서 동생 방으로 들어갔다. 동생은 엄마와 부둥켜안고 울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못되게 구는지 모르겠어. 나 사춘기인가 봐. 엉.”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돼가지고 속 좁게 말도 안 하고. 엄마는 갱년기인가 봐.”
“갱년기? 엄마, 그거 큰 병이야? 엄마 죽지 마아앙!”
“엄마가 죽긴 왜 죽어. 예린이랑 오래오래 같이 살 거야.”
아빠가 내 옷을 잡아끌고는 방에서 나와 문을 닫았다. 아빠와 둘이 거실에 덩그러니 앉았다.
“예찬아.”
“네.”
“우리 집은 우리가 잘해야 한다.”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한마디였다. 그랬다. 사춘기와 갱년기. 우리가 잘 버텨야 했다. 아빠가 갑자기 일어섰다.
“어디 가시게요?”
“설거지.”
싱크대를 보니 그릇이 쌓여 있었다. 밥 먹고 바로 두 모녀의 담화가 성사돼서 설거지거리가 그대로였다.
“제가 할게요.”
“됐어.”
고무장갑을 끼는 아빠의 뒷모습이 모처럼 즐거워 보였다.
“예찬아.”
“네.”
“엄마가 그러는데, 너 중간고사….”
“숙제하러 갈게요.”
역시 베란다보다는 내 방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피신처였다.
아침이 소란스러웠다. 동생은 눈이 부었다고 호들갑이었고, 엄마는 자기 눈도 팅팅 부었으면서 동생 눈에 얼음찜질해 주고 밥까지 먹이느라 정신이 없었다. 베란다에 아침 햇살이 들었다. 화초가 싱그럽게 반짝였다. 큰 줄기에 기대고만 있던 작은 줄기가 이번에는 큰 줄기를 안아주고 있었다.
